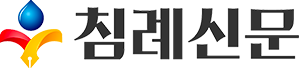국가조찬기도회는 우리 현대 교회사의 유산이다. 1966년 첫 기도회에서 시작된 전통은, 여야 정치인과 교계가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해 온 상징성을 지닌다.
이 역사성은 가볍지 않다. 물론 논란도 있다. 과거 독재정권과 유착해 권위주의 정부를 정당화했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임원진의 비리 의혹과 12.3 계엄 주도자들 상당수가 2024년도 국회조찬기도회에 참석했다는 부분 때문에 비난을 넘어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들리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폐지가 답일까? 국가조찬기도회의 의미와 상징, 역사를 놓고 본다면 오늘의 위기는 ‘폐지’로 끝낼 일이 아니라, ‘보수의 책임’을 다해 고쳐 살려야 할 문제다.
먼저 주최의 원칙을 본래 자리로 돌려야 한다. 한국기독교언론포럼이 지난 10월 29일 개최한 가을포럼에서 김철영 목사(기공협 상임대표)는 “국가조찬기도회의 태동은 국회조찬기도회라는 공적 의사 플랫폼과 맞닿아 있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체제가 행사 운영의 연속성에 기여한 면이 있더라도, 오늘의 오해와 혼란을 해소하려면 국회조찬기도회가 책임 있게 앞장서고, 교단·연합기관이 투명하게 협력하는 구도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권위주의적 의전과 보여주기 관행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 대통령 ‘별도 입장’, 특급호텔 중심 운영, 과도한 귀빈 중심 진행은 기도의 본질을 가린다. 행사 명칭과 형식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본래 취지를 드러내도록 단순화해야 한다. 절차와 재정, 초청 기준은 사전에 공개해 누구나 검증 가능하게 하는 것이 올바를 것이다. 신앙의 권위는 의전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다음은 공공성의 회복이 필요하다. 최근 불거진 각종 의혹과 논란은 논란 그 자체로 신뢰를 잠식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보수’는 체면이 아니라 공의와 책임이다. 준비위원회 구성, 재정 집행, 설교·기도문 기획 과정을 투명화하고, 특정 개인·집단의 영향력 사유화를 차단해야 한다.
내용의 회개와 방향 전환 또한 필요하다. 국가조찬기도회가 권력에 아부하는 장으로 비칠 때 그날의 기도는 힘을 잃는다. 사회적 약자, 재난 유가족, 이주민·노동자와 함께 울고 기도하는 순서를 담대히 넣자. 전국 교회가 같은 날 동일한 기도문으로 함께 드리는 ‘분산형 연합 기도’도 검토할 만하다. 보수의 정체성은 가난한 이웃을 잊지 않는 책임의 윤리에서 증명된다.
마지막으로 신학적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 ‘민족 복음화’라는 열정이 국가 권력과 동일시로 흐르지 않도록, 신앙의 초월성과 시민사회적 공공성 사이의 ‘창조적 긴장’을 유지해야 한다. 강단과 권력의 거리가 멀수록 기도의 진정성은 가까워진다. 이것이 개혁을 원하는 건강한 보수의 길이다.
국가조찬기도회를 지키는 길은 ‘예전처럼’이 아니다. 더 엄격한 투명성, 더 낮은 자세, 더 넓은 참여로 새 틀을 짜야 한다. 역사를 이유로 안주하지 말고, 역사 때문에 더 엄정하게 스스로를 바로 세우자. 보수의 이름으로 폐지 대신 환골탈태를 선택한다면, 이 기도회는 다시 공적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