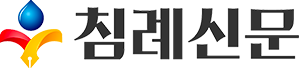농촌교회가 점점 소멸되고 있다. 농촌 인구가 줄어들면서 마을 자체가 사라지고, 그 마을의 대표적 인프라라 할 수 있는 교회도 명맥을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농촌교회에 부임한 한 목회자는 예배보다 고령의 성도들을 돌보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토로한다. 장례예배는 이제 농촌 목회자의 주요 사역 중 하나가 돼 버렸다.
농촌교회를 살리기 위한 한국교회의 다양한 시도는, 그 생존이 곧 한국교회의 존속과 직결된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출발했다. 교계 연합기관을 중심으로 농촌교회와 지역 성도들이 생산한 특산물을 바자회나 장터 등을 통해 유통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일회성 행사에 그쳤다. 농특산물의 품목도 다양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사실 한국교회 부흥의 절정은 1990년대였다. 도시로 몰려드는 인구의 흐름에 따라, 지방과 농촌의 교인들은 자연스럽게 도시교회로 옮겨 갔다. 물론 지방과 농촌에 남아 교회를 섬기며 신앙을 지킨 그리스도인들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대 말 이후, 한국교회는 정체기에 들어섰다. 대도시 중심의 사역, 지역 불균형, 저출산, 주 5일제 시행 등의 변화 속에서 교회는 양적 성장의 둔화를 겪기 시작했다. 한때 1200만 명이라던 성도 수는 이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고, 교회학교와 청년층의 이탈로 인한 고령화는 도시뿐 아니라 농촌에서도 피부로 느껴질 만큼 심각해졌다.
그렇다면 농촌과 농촌교회에는 정말 희망이 없는 것일까? 교회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먼저 찾아야 한다. 지역 공공기관과 협력해 지역민을 돕는 사역에 앞장서고, 마을 환경 개선이나 귀농자와 현지인의 연결을 돕는 프로젝트 등을 통해 지역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교회는 지역의 사랑방 같은 공간이 돼야 한다. 무조건 복음을 들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나눔과 섬김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농촌 계몽 사역이나 지자체 사업 등을 꼼꼼히 살펴,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유익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과의 협력도 모색해야 한다.
교회의 문은 누구든 자유롭게 들어설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 스스로 문턱을 낮춰야 하며, 목회자가 먼저 교회 밖으로 나가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 이는 신학교에서 배우는 이론이 아니라, 현장 중심의 목회로의 과감한 전환을 뜻한다.
안타깝게도 2025년의 목회 환경은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넘어, 무관심이라는 더 깊은 장벽에 직면해 있다. 대형 집회에서조차 하나 된 목소리가 ‘교회 이기주의’ 또는 ‘교회 혐오’로 비춰지는 현실이 이를 방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한다. 초대교회처럼 이웃을 돌보고 지역을 변화시키며, 끊임없는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거듭나야 한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는 사도 요한의 가르침은, 지금 이 시대에 더욱 절실한 한국교회의 메시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