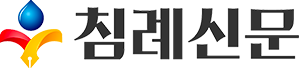윌리암스 박사에 의하면, 관료후원적 종교개혁가들과 근원적 종교개혁가들은 교회개혁에 대한 근본적인 전제가 달랐다고 진단하였다. 전자는 “개혁”(reformatio)이라는 개념을 전제로 하여, 개혁의 대상이 되는 당시의 로마가톨릭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던 사람들이었고, 후자는 “회복”(restitutio)이라는 보다 근원적인 개념을 전제로 하여, 신약성서에 제시되어 있는 교회를 회복하여 16세기에 재현하고자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다.
16세기 당시의 유럽 기독교계에서는, 유아 밥티스마 전통을 부정하고, 오직 신자들 즉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밥티스마를 베풀고, 세속정치 권력과는 무관한 순수한 신앙공동체를 추구했던 운동은 너무나 “과격한”(radical) 것이었다. 그러나 성서적 아나뱁티스트들이 16세기에 추구했던 신앙공동체가, 바로 신약성경이 보여주는 초대 기독교의 교회 모습이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Early Church) 혹은 “신약성서적 교회”(New Testament Church)는 세속정치에 물들지 않은 교회였고, 세속정치 권력으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머리로 하고 그 분만을 따랐던 신자들의 공동체였다. 이러한 교회를 회복하고자 했던 것이 성서적 아나뱁티스트들의 꿈이자 믿음이었다. 그들은 단순히 로마가톨릭 교회를 개혁하는데 만족할 수 없었다.
그러나 수십 세기 동안 유아 밥티스마 전통을 이어왔던 로마가톨릭 교회와 그러한 전통을 여전히 답습했던 관료후원적 종교개혁가들의 입장에서는, 유아 밥티스마의 유효성을 부정하며 오직 신자들에게만 밥티스마를 베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무리들은, 당시 유럽사회의 영적인 기저를 뒤흔드는 “과격한” 사람들로 보였다. 이 말은 뒤집어서 표현하면, 근원적 종교개혁가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관료후원적 종교개혁가들의 종교개혁이 충분히 과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근원적 종교개혁가들은 관료후원적 종교개혁가들이 로마가톨릭 교회의 교황제도와 교권체제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교리적 도덕적 부패 등을 개혁하려고 했지만, 적지 않은 부분에서 중세 로마가톨릭 교회의 모습을 여전히 계승하고 있었다고 본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근원적 종교개혁가들의 눈에는 루터교회와 개혁교회(장로교회) 그리고 영국국교회(성공회)는 여전히 유아세례라는 로마가톨릭적 잔재를 유지하고 있었고,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구약적이고 신정정치적(theocratic)어서, 신약성서적 교회의 모습으로 충분히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근원적 종교개혁을 “종교개혁 속의 종교개혁”(The Reformation in the Reformation), 혹은 “항의자들에 대항한 항의자들”(Protestants against Protestants)이라고 불리우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정치권력이나 부유한 자들의 후원을 받지 못한 무산대중(The Have-nots)의 개혁이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좌파들”(Leftwings of the Reformation), “종교개혁의 서자들”(Stepchildren of the Reformation), “종교개혁의 볼세비키들”(Bolsheviki of the Reformation)이라고 불리웠다. 그들은 또한 루터로부터는 경멸적인 어조로 “광신자들”(Die Schwaermer, The Hot-tempered)이라고 불리우기도 하였다.
더 나아가서 조지 윌리암스 박사는 근원적 종교개혁가들을 크게 세 부류(아나뱁티스트들, 신령주의자들, 복음적 이성주의자들)로 분류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계에서는 이러한 분류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각 부류에 대해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세례파”라고 하면 매우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사람들로 잘못 인식되고 있다. 심지어 한국의 기독교계에서는 오늘날에도 그들이 이단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물론 근원적 종교개혁가들 중 일부의 사람들(신령주의자들)은 지나치게 성령의 직통계시를 강조하여 너무 주관적이고 종말론적이고 폭력적인 경우도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모든 근원적 종교개혁가들을 무턱대고 광신자들, 시한부 종말론자들,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 무정부주의자들, 뮌스터 폭동(Muenster Revolt)에 가담했던 자들 그리고 방탕자들(Libertines)로 간주하는 것은, 근원적 종교개혁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없거나 부족한 데서 생긴 오해이다. 성서적 아나뱁티스트들을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종말론적인 신령주의자들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3. 반종교개혁
반종교개혁(Counter Reformation)이란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운동에 대한 로마가톨릭 교회의 대응이자 반작용이었다. 로마가톨릭 교회 내에서도 양식 있는 신학자들과 성직자들 사이에서 교회 내의 구조적인 부패와 성직자들의 부도덕에 대해 염려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다. 특히 신애회(Oratory of Divine Love)에 속해 있던 야코포 사돌레토(Jacopo Sadoleto), 레기날드 폴(Reginald Pole), 지안 피에트로 카라파(Gian Pietro Caraffa) 등은 당시의 방만했던 수도원들에 대한 개혁과 교회 내부의 정화를 외치면서 프로테스탄트 개혁운동의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었다. 특히 지안 피에트로 카라파는 나중에(1555년) 교황(敎皇)으로 선출되어 바울 4세(Pope Paul IV, 1476-1555-1559)로 즉위하였다.
교회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던 교황 바울 3세(Pope Paul III, Alessandro Farnese, 1468-1534-1549)는 콘타리니(Contarini)를 위원장으로 하여 9명의 위원들로 개혁위원회(Reform Commission)를 구성하였는데, 동 위원회는 1537년에 “교회의 개혁을 위한 제언”(Advice concerning the Reform of the Church)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동 보고서에 의하면, 교황청이 지나치게 세속화 되어 있음과, 교황과 추기경들, 그리고 고위직에 있는 성직자들이 뇌물거래, 면죄부(Indulgence)의 오용과 남용, 교회법령의 무시, 축첩과 성적인 문란 등의 부정행위들을 범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더 나아가서 교황 바울 3세는 제19차 공의회(Ecumenical Council)를, 1545년 12월에 이탈리아 북부의 작은 도시 트렌트(Trent)에서 소집하여, 크게 3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다(1545-1547, 1551-1552, 1562-1563).
트렌트 종교회의는 중세 로마 가톨릭 신학을 재확인하면서,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운동의 불법성을 부각시켰고, 동시에 로마가톨릭 교회의 성직자들의 도덕성을 회복하여, 새로운 시대를 적극적인 자세로 맞이하고자 하였다. 결국 반종교개혁운동은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지의 로마가톨릭교회를 더욱 공고히 하였고, 폴란드의 기독교를 로마가톨릭교회로 복귀시키는데 성공하였다. 동시에 유럽 내에서 잃어버린 로마가톨릭 세력을 회복하기 위해 눈을 해외로 돌려,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중남미 아메리카 등지에 많은 선교사들을 파견하는 등 해외선교 활동에 박차를 가하였다.
II. 근원적 종교개혁
조지 윌리암스 박사는 근원적 종교개혁가들(Radical Reformers)을 크게 세 부류로 분류하고 있다: 복음적 이성주의자들(Evangelical Rationalists)과 신령주의자들(Spiritualists)과 아나뱁티스트들(Anabaptists). 이들에 대한 구분의 근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권위(authority)인가?” 하는 점이었다.
윌리암스 박사는 위의 분류를 보다 자세하게 세분하였다. 아나뱁티스트들을 혁명적(Revolutionary) 아나뱁티스트들, 명상적(Contemplative) 아나뱁티스트들, 복음적(Evangelical, 혹은 성서적 Biblical) 아나뱁티스트들로 나누었고, 그리고 신령주의자들을 혁명적(Revolutionary) 신령주의자들, 이성적(Rational) 신령주의자들, 복음적(Evangelical) 신령주의자들 등으로 구분하였다. 본고에서는 이상의 근원적 종교개혁가들을 크게 대별하여 복음적 이성주의자들, 신령주의자들, 성서적 아나뱁티스트들로 분류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 복음적 이성주의자들
“복음적 이성주의자들”(Evangelical Rationalists)은 신앙생활에서 인간의 이성(reason)을 권위로 생각했던 사람들이다. 성경말씀이나 기독교의 주요교리들 가운데서, 이성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들만 받아들이는 자들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전통적인 기독교 신론인 삼위일체론을 부인하는 자들(Anti-trinitarians)이었고, 성서에 등장하는 초자연적인 내용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이었다.
대표적인 복음적 이성주의자들은 파우스투스 소치누스(Faustus Socinus), 마이클 세르베투스(Michael Servetus), 후안 드 발데스(Juan de Valdes), 세바스티안 카스텔리오(Sebastian Castellio), 게오르게 비안드라타(George Biandrata) 등이었다. 이들은 18세기의 이신론자들(Deists)과 19세기말의 신학적 자유주의자들(Theological Liberals)의 출현을 스스로 예고하는 자들이었다.
/ 김승진 교수 침신대 신학과(역사신학) 예사교회 협동목사